밖에는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거실은 조금 습해서 바닥이 발바닥에 쩍쩍 달라붙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아늑하다. 노란 간접등이 켜져있고, 우리는 마트에서 사온 짭짤한 오징어 과자를 질겅질겅 씹으며 책을 읽는다.
나는 몇 주간 나의 잠들기전 침실 독서를 책임지고 있던 소설의 막바지 부분이 궁금해 잠들기 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설에 몰입해서 읽고 있었다.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중 2권 <새로운 이름의 이야기>를 읽는 중이었음. 몰입력 말해 뭐해. )
같이 책을 읽던 D는 왜 수준있는 사회 과학 서적은 안 읽고 왜 맨날 재미만 추구하면서 소설만 읽느냐고 한다. 내가 재미를 추구한다고? 아니다, 난 소설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는 중이란 말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상황과 마음들, 내가 겪어본 혹은 겪어보지 않은 수많은 상황들을 소설 속에서는 마음껏 상상하고 좀 더 심도있게 관찰할 수 있다. D는 왜 그걸 모르는거지. 왜 소설을 킬링 타임용 드라마와 동급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다.
알랭드 보통의 <동물원에 가기> 라는 산문집에 들어있는 “글쓰기(와 송어)” 라는 에세이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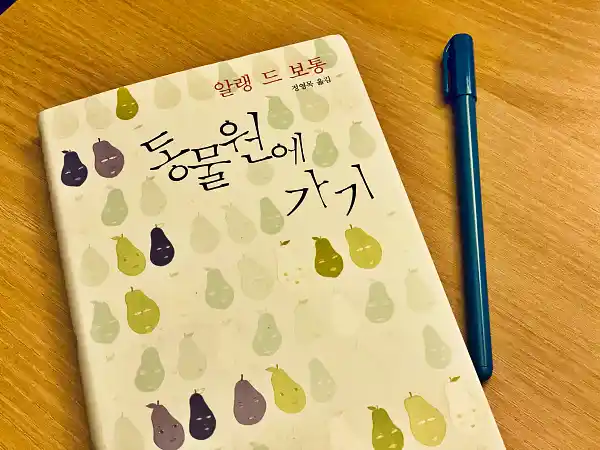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읽다보면 역설적으로 나 혼자 파악하려 할 때보다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책에 있는 말을 읽다 보면 전보다 더 생생한 느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세계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된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짝사랑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다. 정치가나 광고업자의 헛배운 어리석음을 보게 해준 사람은 플로베르의 오메(보바리 부인의 등장인물)다.
내가 질투심에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프루스트의 고통스러운 구절들 덕분이다.
알랭드 보통 <동물원에 가기>
위대한 책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슷한 감정이나 사람들의 묘사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이들을 훨씬 더 잘 묘사한다. 독자가 읽다가 이것이 바로 내가 느꼈지만 말로 표현을 못하던 것이라고 무릎을 치게 되는 구석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설에 나와있는 이런 장면이다. 프루스트가 만들어 낸 게르망트 공작 부인은 오만하고 무례한 구석이 있는 인물이라고 막연히 느끼고는 있지만 독자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건지는 모른다. 이때 저녁식사 장면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갈라르동 부인이 오리안 드 롬 이라고 알려진 공작 부인과 친한 척을 하고 싶었던 나머지 호칭을 빼고 “오리안” 하고 부른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게르망트 공작부인의 괄호속에 표현된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 막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된다.
“오리안”(즉시 게르망트 부인은 즐거우면서도 놀란 표정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제삼자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제삼자를 증인으로 세워 갈라르동 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를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두는 것 같았다)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부인의 행동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대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게다가 우리는 공작 부인의 성격과 그 순간의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평소 치밀하게 인간에 대해 관찰한 작가만이 이런 디테일한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테일이 있는 소설들을 읽다보면 나의 글쓰기 레이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 글로 써내는 것이 작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나는 소설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희미한, 그럼에도 치명적인 떨림을 포착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는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을 내려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작가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반응을 보였을 만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정신은 새로 조율된 레이더처럼 의식을 떠다니는 대상들을 포착한다. 마치 조용한 방에 라디오를 가져다놓는 것과 같다. (중략)
이제 우리는 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늘의 음영에, 한 사람의 얼굴의 변화무쌍함에, 친구의 위선에, 이전에는 우리가 슬픔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부터 밀려오는 축축하게 가라앉은 슬픔에.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천지차이로 달라진다.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다르다.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팩트를 알려주는 비문학 책들도 분명 읽어야 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미묘한 디테일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겪어본, 혹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상황 속으로, 그들의 작은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로서 내가 소설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와 길고 긴 합리화를 마친다ㅋㅋ






Leave a Comment